
지난주 한 TV 프로그램에서 다룬 ‘정인이 사건’이 화제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아기가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방송 이후 양부모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고, 이런 여론에 맞춰 국회에서는 자녀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과, 학대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너무 관대하게 인정해 줌으로써,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가혹한 체벌이 가해진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정인이 사건’이 촉발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필자에게 있어 이번 사건은 한편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 정인이 양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인들의 증언을 보면서, 필자의 양육태도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아이의 장애를 알고 한없이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던 때가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붙들고 함께 죽자며 울부짖던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수십 번 말을 해도 계속 같은 짓을 하는 아이에게, 화가 폭발해 소리를 지른 적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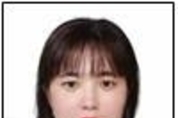
어려서부터 경쟁이 익숙한 사회에서 살아온 필자인지라, 어느 곳이나 경쟁이 있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좋은 결실을 가져가야 하고, 진 사람은 당연히 그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했던 불합리함은 경쟁의 승부와는 다른 결과, 혹은 경쟁과 상관없이 부모 빽으로 성공의 열매를 가져가는 것 정도였다. 그런데 장애 아이를 키우다보니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오로지 나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걷다가, 아이를 통해 비로소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키우면서 유아독존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더군다나 손이 많이 가는 장애 아이는 말할 것도 없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본의 아니게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큰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고맙습니다보다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그저 평범한 이웃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고마움을 느낀다. 나의 삶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로서 말이다. 장애 여부를 떠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점점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공동체’.. 요즘